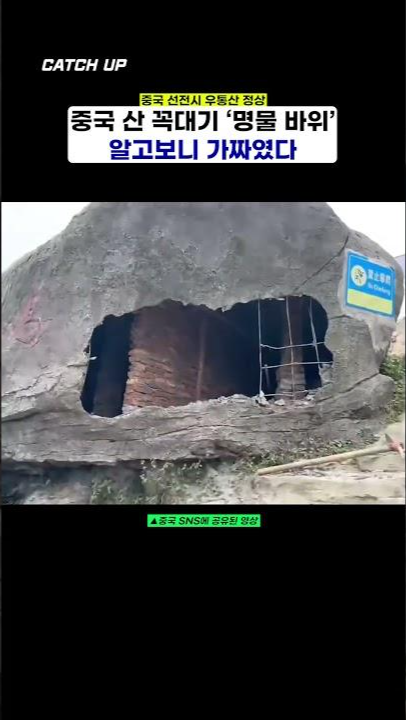실명 위기에도 세상을 기록한 뭉크 [으른들의 미술사]
입력 2024 06 27 08:00
수정 2024 06 27 08:00

뭉크, ‘흐트러진 시야’, 1930, 캔버스에 유채, 80.5x64.5cm, 뭉크미술관.
뭉크의 오른쪽 눈에는 피가 응고되어 생긴 ‘암점’(시야 내에 있는 둥근 모양의 시야 결손 부위)과 얼룩이 생겼다. 때로는 이 반점들이 떠다니며 시야를 어지럽혔다. 이 때문에 왜곡된 세상과 올바른 시각이 겹쳐 보였다.
누적된 피로로 생긴 급성 안과질환뭉크의 눈 상태에 대한 치료는 저명한 노르웨이 안과의사 요한 레더(Johan Raeder) 박사의 자문 기록에서 알 수 있다. 레더 박사는 뭉크에게 안정적 가료를 요한다는 짧은 소견서를 함께 첨부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든 눈에 영향을 미쳐 안구 출혈과 같은 심각한 일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뭉크는 몸 여기저기서 신호를 보낼 만큼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친 상태였다.
푹 쉬라는 의사의 조언에도 뭉크는 작품 제작과 함께 이 상황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 뭉크 작품의 특징은 하나의 윤곽선이 아닌 여러 개의 동심원으로 표현되었다. 때로는 그림자가 여럿 겹쳐서 표현되기도 했다. 출혈이 덜한 날에는 암점 대신 그림자를 동반한 실 같은 잔상이 남았다.
뭉크는 시력 회복에 힘쓰면서 새로운 유형의 작품을 제작했다. 뭉크는 작품을 제작할 때 시간, 장소 등도 꼼꼼히 기록해 두었으며 이곳이 전등 아래인지 햇빛 아래인지도 기록해 두었다. 이때 그린 ‘흐트러진 시야’에는 새의 머리처럼 보이는 얼룩 반점과 여러 윤곽선이 겹쳐 보인다.
자신의 병을 예술로 승화시킨 예술가안과 질환을 앓은 예술가들은 종종 있었다. 드가는 젊었을 때부터 광선증을 앓아 햇빛 속에서 그림을 그릴 수 없었으며 모네도 말년에 백내장을 앓아 그 시기 수련 그림은 색채의 조화가 깨져버렸다. 이들은 안과 질환으로 작품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고 또 그로 인해 붓을 놓아야만 했다.
그러나 뭉크는 이 시기 출혈을 동반한 안과 질환으로 본 세상을 그림으로 기록한 것이다. 뭉크는 시련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주하고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뭉크는 병을 치유하고 위안을 얻었다. 뭉크 예술의 힘은 여기에 있다.
뭉크는 절대적 안정을 권했던 레더 박사의 충고를 잘 듣지 않은 듯하다. 6년 후 왼눈에 똑같은 안구 출혈 증상을 동반한 시력 저하 증상을 겪었다. 뭉크는 또 한 번 검은 반점과 여러 윤곽선을 그리며 세상 사람들을 위로했다. 뭉크가 그린 세상은 이렇게 두 세계의 조화 속에 있었다.
이미경 연세대 연구교수·미술사학자 bostonmural@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