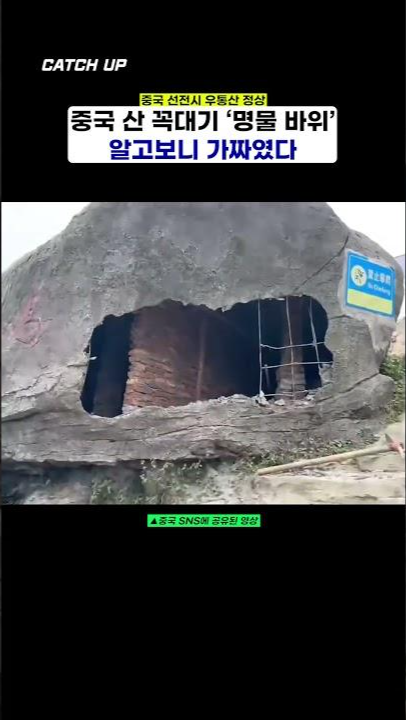공간의 깊이, 그리고 깊이에의 강요 [노승완의 공간짓기]
입력 2024 02 29 08:00
수정 2024 02 29 08:00

충주호 주변에 지어진 한 카페는 지면보다 낮게 건물을 배치해 들어가는 입구가 지하로 연결된다. 입구 반대편으로 충주호와 앞산 전경이 펼쳐진다.
“당신의 작품은 재능이 있고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아직 깊이가 부족합니다.”
그녀는 그 날 이후 깊이에 대해 매일 고뇌하고 방황하던 끝에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 책을 읽은 30대 중반부터 건축에도 깊이있는 건축이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건축은 공간을 만드는 학문이고 건축가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에는 분명 그 깊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의 깊이(depth of space)가 아니라 시간, 빛, 공간감, 창작성, 주변과의 조화, 디자인 철학 등 공간에 대한 끝없는 고민과 작가의 디자인 의도 등이 풍부하게 혹은 절제되어 그 공간에 표현되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의 깊이’(depth of thinking). 얼마전 충주호 주변에 위치한 카페에 들렀다가 ‘공간의 깊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지면보다 낮게 설계된 충주호 한 카페에서는 충주호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외벽 마감 또한 튀는 색상으로 도색을 하거나 장식을 하기 보다 노출콘크리트 그대로 두어 인위적인 건물이지만 주변의 흙, 나무, 돌 등과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지하로 들어가 주문을 하고 나면 메인 건물이 있는 공간으로 이동을 해야 한다. 이 때 지하 건물과 메인 건물 사이의 전이 공간을 만나게 된다.

지하 건물과 메인 건물 사이에 있는 전이공간. 기존 레벨을 훼손하지 않고 최대한 살려 건물을 앉힌 탓에 레벨차이가 많아 계단으로 건물들이 연결되어 있다. 우측 계단을 통해 메인 건물로 올라갈 수 있다.
또한 바닥에는 커다란 돌을 놓고 지붕에는 천창(top light)을 내어 낮에는 파란 하늘을, 밤에는 별을 볼 수도 있다. 전면 공간을 통해 앞마당으로 나갈수도 있고 다시 들어와 메인 건물 혹은 서비스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는 말그대로 전이공간이다.

전이공간을 지나 메인 건물로 올라서면 투박한 콘크리트 벽체와 스틸재질의 테이블로 구성된 메인 공간이 나타난다. 우측 전면 유리창은 여름철에 활짝 열 수 있는 폴딩도어로 되어 있어 개방감을 극대화시켰다.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잠시 멍하니 있었다. 그러다 이내 이 건물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지었을까, 이렇게 외딴 공간에 이토록 공을 들인 건축가는 누구일까, 공사비는 얼마나 들었을까, 용적률을 손해봤을 것 같은데 건축주가 어떻게 동의했을까 등 다양한 생각들이 나를 괴롭혔다.

오전의 태양빛이 인공 연못으로 쏟아진다. 건축가는 필히 태양 고도에 따른 빛과 그림자의 위치를 세심하게 계산했을 것이다. 노출콘크리트로 길게 뻗은 지붕 슬래브 밑에 물이 타고 들어오지 않도록 물끊기 홈을 야무지게 파 놓았다.
“(중략) 벽은 경사진 대지를 가로지르며 마당을 나누고 공간의 켜를 연결한다. 이 위에 수평적인 판이 얹히고 안과 밖의 경계를 형성한다. 벽과 지붕은 입체적인 지형에 다양한 켜와 틈을 형성하며, 그 사이 바람과 빛이 스며들 여지를 만든다…(중략) 대지에는 돌과 콘크리트, 벽과 판, 자연과 인공 사이 상호적인 관계가 공존한다. 서로 다른 대상의 관계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둘의 경계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사물의 경계에서 때로는 부딪힘을 형성하지만 다름의 본성은 사실 다르지 않음을 인지하게 된다. 결국 경계는 흐릿해지고 관계의 중요성이 떠오른다.”

메인 건물을 돌아 나오면 다시 지상으로 나와 울퉁불퉁 투박한 거대한 돌기둥(실제로는 콘크리트)을 마주하게 된다. 거대한 암석이 넓은 콘크리트 판을 떠받치고 있는 형상이다.
메인 건물을 내려오면 다시 지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때 콘크리트 덩어리로 만든 거대한 기둥을 만날 수 있다. 의도적으로 자연적인 기암괴석을 형상화하기 위해 울퉁불퉁하게 만들었겠지만 실제 공사시 남은 레미콘을 조금씩 모아 이 기둥을 만들었다면 더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다.
건물을 둘러볼 수록 르 꼬르뷔지에, 루이스 칸, 안도 타다오의 작품에서 보이던 미니멀리즘, 노출콘크리트를 이용한 빛과 그림자, 물의 반사, 스틸과 유리의 조화 등의 건축 기법들이 조금씩 스쳐지나갔다. 특히 안도 타다오의 아와지 유메부타이, 뮤지엄 산에서 볼 수 있는 디테일들이 오버랩됐다.

일본의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뮤지엄 산.
무엇이 공간의 깊이를 결정하는가? 그건 적어도 공간의 본질, 목적을 가장 최우선으로 둔 건축계획일 것이다. 단순히 경제논리에 맞춰 건축법상 최대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찾아내는 것에서 벗어나 건축가 혹은 건축주가 이 공간을 통해 얻고자 하는 유무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그것은 정적인 시간일 수도 빛이나 물을 담아내는 것일 수도, 추억을 이끌어내고 기억과 시각을 각인시키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진정한 깊이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보는 사람들이 저절로 느끼게 되는 그 “무엇”이 아닐까?

.지하 건물과 메인 건물 사이에 만들어진 전이 공간.
“뛰어난 재능을 가진 젊은 사람이 상황을 이겨 낼 힘을 기르지 못한 것을 다같이 지켜보아야 하다니…(중략) 소박하게 보이는 그녀의 초기 작품들에서 이미 충격적 분열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사명감을 위해 고집스럽게 조합하는 기교에서, 이리저리 비틀고 집요하게 파고듦과 동시에 지극히 감정적이고 분명 헛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피조물의 반항을 읽을 수 있지 않은가? 숙명적인, 아니 무자비하다고 말하고 싶은 그 깊이에의 강요를?”
노승완 건축 칼럼니스트·건축사·기술사 arcro123@hobancon.co.kr